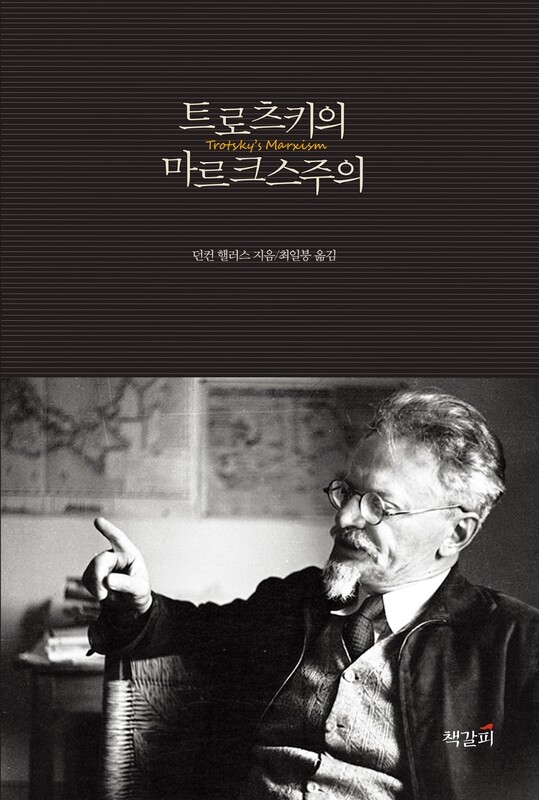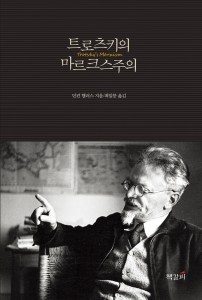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
트로츠키도 레닌만큼이나 굳게 ‘혁명적 부르주아지’에 대한 의존을 배격했다. 그는 멘셰비키의 도식을 다음과 같이 조롱했다.
민주주의 혁명가들인 자코뱅 당이 프랑스 혁명을 끝까지 수행했듯이 러시아 혁명도 혁명적 부르주아지의 민주주의에만 권력을 이양할 수 있다는 것은 …… 언론인적 유추와 연역을 통해 만든 초역사적 범주다. 멘셰비키는 이런 식으로 혁명에 대해 확고한 대수적 공식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있지도 않은 산술적 가치를 대입시키려 한다.
이 밖의 다른 모든 점에서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은 볼셰비키의 주장과 달랐다. 그 이론은 러시아계 독일인 마르크스주의자 파르부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첫째, 연속혁명론은 농민이 독립적인 정치적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
농민은 혁명적이기는 하지만 혁명을 지도하는 구실을 할 수 없다. 역사는 부르주아 국민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과제를 농민에게 맡길 수 없을 것이다. 분산성, 정치적 후진성, 그리고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틀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심층적인 내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농민은 한편으로 농촌에서 자생적 반란을 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 군대 내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통해 구질서의 뒤통수를 조금 세게 때릴 수 있을 뿐이다.
…… 이것은 결국 노동자 정부 수립을 뜻할 수밖에 없고, 레닌의 ‘민주주의 독재’는 단순히 착각일 뿐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지배는 그들의 경제적 노예 상태와 양립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가 어떠한 정치적 깃발 아래 권력을 장악하든지 간에 프롤레타리아는 사회주의적 정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부르주아 혁명의 내적 메커니즘에 의해 정치적으로 지배적 위치에 올라선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사명을 부르주아지의 사회적 지배를 위한 민주공화국적 조건들을 조성하는 데 국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사 프롤레타리아 자신이 그러길 원한다 해도, 허황하기 이를 데 없는 공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즉시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모두 사회주의의 물질적·인간적 토대, 즉 고도로 발전한 산업과,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마르크스가 말한 ‘대자적’ 계급으로서 조직과 의식을 획득한 근대 프롤레타리아가 러시아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
그럼에도 트로츠키는 오직 노동계급만이 러시아 혁명에서 지도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수중에 권력을 장악하고야 말리라고 확신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혁명 정부는 사회주의의 객관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이 문제들의 해결은 러시아의 경제적 후진성 때문에 가로막힐 것이다. 일국 혁명의 틀 안에서는 이 모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노동자 정부는 처음부터 자신의 세력과 서유럽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세력의 단결이라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노동자 정부의 일시적인 혁명적 헤게모니가 비로소 사회주의 독재의 서막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에게 연속혁명은 계급의 자기 보존 문제가 될 것이다.